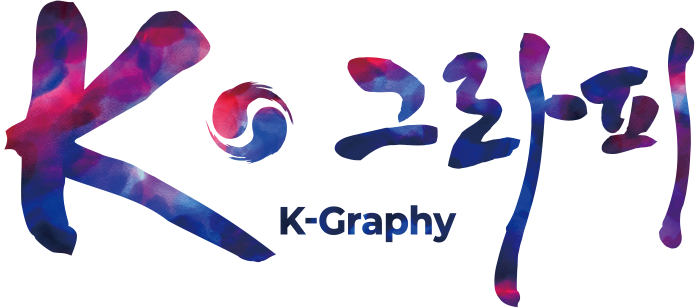K-그라피 이길주 기자 | 강물은 흐르다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는다. 정호승의 시 「봄길」은 이처럼 상실의 언어로 시작한다. 그러나 시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이는 자리에서, 시인은 ‘보라’고 말한다.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경진 작가의 작품은 이 시의 핵심 문장을 회화적 사유로 확장한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검은 획은 길이자 숨이며, 멈춤과 진행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의 흔적이다. 번짐과 여백은 끝과 시작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붉은 매화는 사라짐 이후에도 남는 감정의 온기를 상징한다. 꽃잎은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 자체가 봄의 방식임을 말하듯 화면은 고요하다.
이 작품에서 ‘길’은 목적지가 아니다. 돌아오지 않는 새들처럼, 다시는 같지 않을 시간의 인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걷는 이를 화면 중앙에 세운다. 사랑이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스스로 사랑이 되어 걷는 사람. 그것이 봄의 윤리이며, 인간의 품격이다.
K-그라피의 미학은 여기서 분명해진다. 글씨는 읽히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획은 감정의 밀도이고, 번짐은 기억의 방식이며, 여백은 침묵의 설득이다. 이경진 작가의 ‘봄길’은 시를 ‘옮긴’ 작품이 아니라, 시가 지나간 자리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의 길이다. 끝난 사랑의 잔해 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걷는다. 그 걷는 태도 자체가 봄이다.

작가 노트 | 이경진 명인
정호승 시인의 「봄길」을 읽으며, 저는 ‘끝난 뒤에 남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감정, 말해지지 않은 마음, 그리고 다시 걷게 만드는 힘.
이 작품에서 길은 선명하지 않습니다. 멈추기도 하고 흐르기도 합니다. 먹의 번짐과 여백은 상실 이후의 시간이며, 붉은 꽃은 끝나지 않은 마음의 흔적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통해 묻고 싶었습니다. 사랑이 끝난 후에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답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묵묵히 봄길을 걷는 것.
그 길 위에 이 작품을 내려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