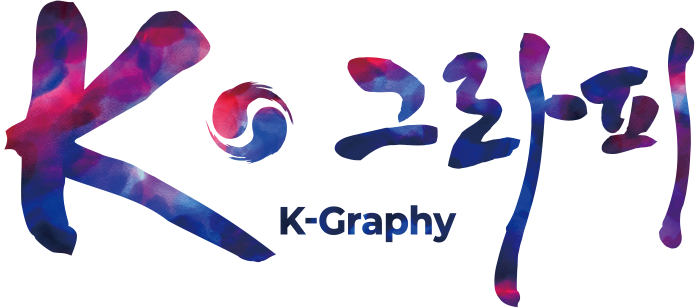K-그라피 이존영 기자 | 김학주의 詩 「쇠별꽃」은 존재의 서열을 조용히 해체한다. 잡초와 꽃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그 답을 ‘이름’이라는 단어 하나로 돌려준다. 모르면 잡초였을 것들도, 이름을 가지면 꽃이 된다. 이 단순한 문장은 삶의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히 짚는다.

김고현 작가의 K-그라피는 이 시의 메시지를 ‘부르는 행위’로 확장한다. 화면을 채우는 보랏빛 번짐은 이름 없는 시간의 층위이며, 그 위에 얹힌 굵은 획은 호명呼名의 순간이다. 글씨는 단정하지 않다. 번지고 흔들린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문장은 또렷해진다. 존재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불려서 선명해진다는 사실이.
‘피어라’라는 명령형은 강요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피어 있는 것을 인정하는 선언에 가깝다. 쇠별꽃은 크지 않고,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이름을 얻는 순간, 그 꽃은 더 이상 밟히는 대상이 아니다. 김고현 작가의 작품에서 여백은 침묵이 아니라 기다림이다. 누군가 불러주기를, 그리고 그 부름이 결국 스스로에게도 닿기를 기다리는 자리다.
K-그라피의 미학은 여기서 분명해진다. 글씨는 전달을 넘어 존엄을 회복하는 도구가 된다. 이 작품은 묻지 않는다. “너는 얼마나 대단한가?” 대신 말한다. “너를 불러줄 이름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꽃이다.

작가 노트 | 김고현 명인
이 시를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오래 머문 단어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불리지 못한 채 지나가고,
스스로도 자신을 부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작업에서는
획을 단정히 다듬지 않았습니다.
번지게 두었고, 흔들리게 두었습니다.
그 자체로도 충분히 불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쇠별꽃은 작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불리는 순간
세상은 그 꽃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 조용히 말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에게도,
불러줄 이름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