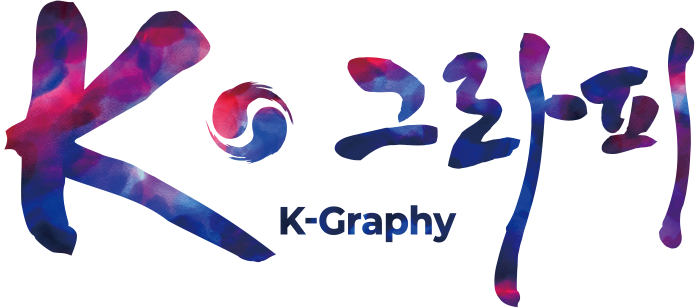K-그라피 이성준 기자 | “완전해야만 빛나는 것이 아니다.” 류시화의 이 문장은 위로를 넘어 존재에 대한 선언에 가깝다. 우리는 늘 더 나아져야만, 더 채워져야만 빛날 수 있다고 배워왔다. 그러나 시는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달을 보라고. 늘 둥글지 않아도, 매 순간 제 몫의 빛을 내는 달을...

조희진 작가의 이 작품은 깊은 밤이다. 별처럼 흩뿌려진 여백과 푸른 어둠 위에 떠 있는 반달은 결핍의 상징이 아니다. 오히려 진행 중인 존재의 얼굴이다.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미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 달은 말없이 증명한다. 굵고 단호한 획으로 쓰인 ‘달’의 형상은 흔들림 없이 화면의 중심을 잡고, 그 주변의 잔잔한 번짐은 시간의 숨결을 남긴다.
이 작품에서 ‘너’는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다. 우리 모두다. 겉으로 보이는 너보다 더 큰 너,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안에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야말로 이 시가 가리키는 빛이다. 조희진 작가는 K-그라피의 언어로 옮겨진 이 시는 읽히기보다 보이며, 이해되기보다 체감된다. 달은 설명되지 않고, 대신 바라보게 만든다.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나는 빛나고 있는가.
이 작품은 답을 서두르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를 분명히 한다. 빛은 완성의 보상이 아니라, 존재의 성질이라는 것. 그래서 이 달은 오늘도, 조금 모자란 채로 충분히 빛난다.

작가 노트 | 조희진 명인
이 시를 쓰며
‘완전함’이라는 말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붓을 들 때마다
잘 써야 한다는 생각보다
지금의 호흡을 남기자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달도 늘 같은 모습이 아니듯,
사람의 마음도 매일 다르니까요.
그래서 여백을 많이 남겼습니다.
채우지 않은 공간이
오히려 빛을 품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작품의 달은
가득 찬 달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밤을 밝히는 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 앞에서
누군가가 잠시 하늘을 떠올리고,
자신을 덜 다그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