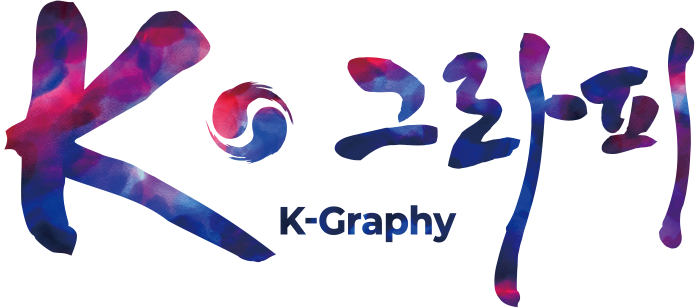K-그라피 이성준 기자 | 박노해의 詩 「길」은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 존재의 태도에 가깝다. 이 시에서 길은 이미 놓여 있는 목적지가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발을 내딛는 순간에 비로소 생성되는 과정이다. “길을 잃으면 길이 차차 안 온다”는 문장은 실패의 선언이 아니라, 멈춤에 대한 경고다. 걷지 않는 한, 길은 오지 않는다.

부선영 작가의 K-그라피는 이 시의 메시지를 구조와 색의 대비로 시각화한다. 작품 중앙에 노랑색으로 쓰인 ‘길’은 단순한 제목이 아니라, 작품 전체의 축이자 심장이다. 검은 먹의 문장들이 불안과 망설임의 흐름처럼 주변을 에워싸고 있을 때, 노랑의 ‘길’은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내면의 표지판처럼 선명히 서 있다.
K-그라피 특유의 거침없는 필획은 망설임 없는 걸음을 닮았다. 번지거나 삐뚤어진 획조차 실패가 아니라 흔적으로 남으며, 그것이 곧 ‘걸어왔음’의 증거가 된다. 이 작품은 말한다. 길은 정답이 아니라 선택이며, 완성이 아니라 지속이라고. 결국 길은 지도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걷는 사람의 몸 안에서 시작된다고...
작가노트 | 부선영 명인
이 작품을 쓰며 ‘길’을 목적지로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길은 늘 불안했고, 언제나 확신보다 망설임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검은 먹으로는 흔들리는 문장들을,
그 한가운데에는 노랑으로 ‘길’을 두었습니다.
노랑은 희망이라기보다 용기에 가깝습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밝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발을 내딛게 하는 힘입니다.
길을 잃는다는 말보다
걷지 않는다는 말이 더 두려웠습니다.
이 작품은 잘 가고 있다는 증명이 아니라,
지금도 걷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길은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 길 위에 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