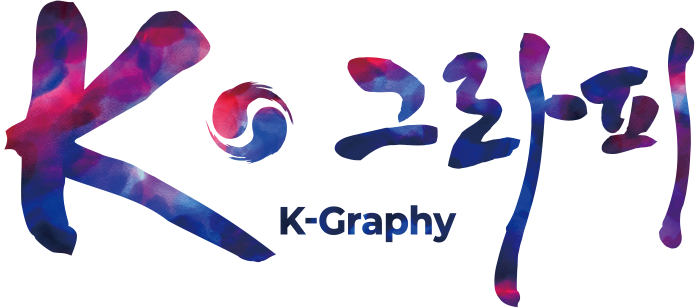K-그라피 이존영 기자 | 윤동주의 시 「조개껍질」은 버려진 것들의 침묵을 오래 바라보는 시다. 파도가 지나간 뒤 남은 조개껍질은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지만,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을 온몸으로 증명한다. 황나현 작가의 K-그라피는 이 시의 시선을 바다 가장자리로 데려온다. 작품 하단에 흩어진 조개껍질들은 풍경의 일부가 아니라, 삶이 남기고 간 기록물이다.

붓으로 적힌 시의 문장은 단정하지 않다. 고르지 않은 획, 일부러 남긴 멈춤은 바닷가의 리듬과 닮아 있다. 파도는 늘 같은 방식으로 밀려오지 않듯, 삶 또한 같은 상처를 같은 말로 남기지 않는다. 황나현 작가는 그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는다. 대신 그대로 둔다. K-그라피의 미덕은 정리보다 수용에 있기 때문이다.
모래 위의 조개껍질은 한때 살이었고, 지금은 껍질이다. 그러나 껍질이 되었다고 해서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비어 있음 때문에, 우리는 더 오래 들여다본다. 이 작품에서 바다는 설명되지 않고, 조개는 말하지 않는다. 말하는 것은 오히려 남겨진 여백이다. 여백 속에서 시는 읽히고, 글씨는 풍경이 된다.
이 작품은 묻는다.
살아 있음이 사라진 뒤에도, 무엇이 남는가.
그리고 조용히 답한다.
남겨진 흔적 하나로도, 우리는 충분히 서로를 기억할 수 있다고...
K-그라피 칼럼 | 시가 풍경으로 눕는 순간
K-그라피는 시를 ‘적는 방식’이 아니라, 시가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작업이다. 황나현작가의 작품에서 윤동주의 시는 중앙을 차지하지 않는다. 글씨는 바다처럼 비켜 서 있고, 이미지와 나란히 호흡한다. 이때 글자는 주장이 아니라 배경음이 된다.
바다의 수평선과 글의 수직 흐름이 교차하며, 화면에는 시간의 좌표가 생긴다. K-그라피는 그 좌표 위에서 문학과 회화를 동시에 작동시킨다. 읽는 이는 글을 따라가다 그림에 멈추고, 그림을 보다가 다시 글로 돌아온다. 이 왕복의 리듬 속에서 시는 ‘이해’가 아니라 체감이 된다.
조개껍질은 말이 없고, K-그라피 역시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말한다.
비어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오래 남는 형태라고.

작가 노트 | 황나현 명인
이 작품을 준비하며
저는 ‘남아 있는 것’보다
‘남겨진 것’을 생각했습니다.
조개껍질은 버려진 존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바다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살아 있던 순간보다,
떠난 이후에 더 많은 이야기를 건네는 것들...
그래서 시의 문장을 단정하게 묶지 않았습니다.
파도처럼 흘러가게 두었고,
모래처럼 흩어지게 두었습니다.
이 작품은 완성보다 머묾에 가깝습니다.
잠시 서서 바라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리...
조개껍질처럼,
이 화면도 그렇게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