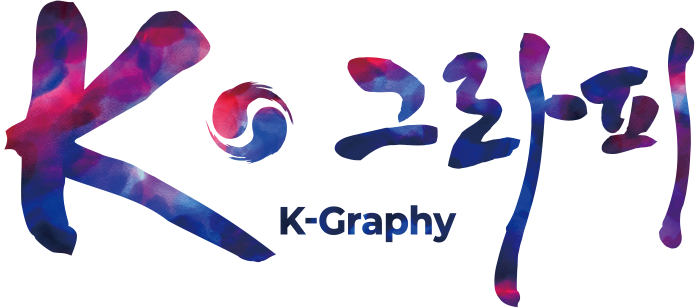K-그라피 이성준 기자 | 어둠은 언제나 크고, 빛은 늘 작다. 그러나 세상은 그 작은 빛 하나로 방향을 정한다.

이경진 작가의 ,나는 반딧불,은 거대한 광명을 말하지 않는다. 이 작품이 선택한 것은 스스로를 태워 길을 밝히는 미약한 생명의 빛, 그 이름 없는 존재의 윤리다.
화면을 가로지르는 굵은 필획은 외침처럼 보이지만, 그 결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외침이 아니라 다짐임을 알게 된다. “나는 반딧불이다.” 이 문장은 선언이 아니라 고백이다.

글씨가 그림이 되고, 그림이 시가 될 때...
이 작품에서 글씨는 정보가 아니다. 의미를 전달하기 이전에 태도를 드러낸다. 붓은 단정하지 않다. 먹은 번지고, 획은 떨리며, 화면에는 황금빛 점들이 흩뿌려져 있다. 이는 완결을 거부한 흔적이자, 삶의 불완전성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작품은 K-그라피가 된다. K-그라피는 잘 쓰인 글씨를 말하지 않는다. 잘 정돈된 그림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묻는다. “이 획에 삶이 있는가.”
반딧불은 스스로를 밝히지 않는다
어둠을 밝힐 뿐이다
작품 속 서사는 낮고 조용하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언어 대신,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잠시 빛나는 존재의 책임을 말한다.
반딧불은 태양이 되려 하지 않는다. 등대도, 횃불도 아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빛 하나가 있기에 어둠은 완전해지지 못한다.

이것이 이 작품이 전하는 윤리이며, 동시에 K-그라피가 말하는 문화의 태도다. 쓰는 순간, 삶이 된다 이경진 작가의 ‘나는 반딧불’은 묻지 않는다. “이것이 글씨인가, 그림인가.”
대신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살아 있는 한 인간의 기록이다.”
한 획을 긋는 순간, 그 사람의 시간과 선택과 침묵이 함께 스며들 때 그 행위는 예술을 넘어 문화가 된다.
그래서 이 작품은 빛난다.
눈부시지 않게,
그러나 끝내 꺼지지 않게...